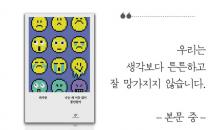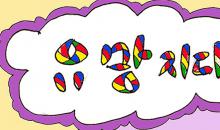[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1] 3부 오름-(80)어도오름, 샘이 있고 위가 평평한 마루 오름
어름비, 고구려어 계통 언어집단이 남긴 유산
- 입력 : 2025. 03.25(화) 03:2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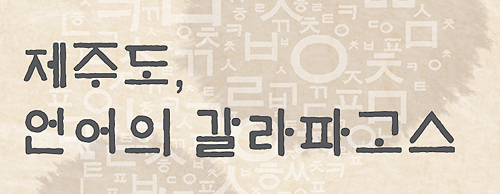
그 뜻이 아리송한 '어름비'
[한라일보] 어도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와 봉성리에 걸쳐 있는 오름이다. 고전에는 도내산(道內山), 어도악(於道岳) 등으로 나오고, 오늘날엔 어도오름, 도노미, 도내미라고 부르고 있다.
이 오름 근처에 있는 마을을 '어음리'라고 한다. 이 마을은 상동과 하동으로 나뉜다. 상동은 '어름비' 일대, 하동은 '부멘이' 혹은 '비멘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어름비', '어림비', '어림빌레'라고 한다. 이 일대의 지명은 여기에 보이는 '도내', '어도', '비멘', '부멘', '어름비'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어름비'는 '빙비(氷非)'라는 표기로 1375년부터 기록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후 '부면'(富面), '어음비리'(於音非里), '부면촌'(富面村), '어음비'(於音非), '부면'(夫面,), '예음비면'(輗音飛面), '어음비리'(於音非里), '부면리'(夫面里), '어음'(於音), '어음리'(於音里), '부면리'(夫面里), '부면동'(夫面洞) 등의 표기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어름비'는 '빙비(氷非)'라는 표기로 1375년부터 기록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후 '부면'(富面), '어음비리'(於音非里), '부면촌'(富面村), '어음비'(於音非), '부면'(夫面,), '예음비면'(輗音飛面), '어음비리'(於音非里), '부면리'(夫面里), '어음'(於音), '어음리'(於音里), '부면리'(夫面里), '부면동'(夫面洞) 등의 표기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우선 고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빙비'(氷非)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오는 '어름비'의 한자 차용 표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나오는 '어름비'는 무슨 뜻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어름비'라는 지명은 '어름+비'의 구조다. 우리 고어에 샘을 '얼'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고려 때 나온 삼국사기 지리지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천정구현일운어을매곶(泉井口縣一云於乙買串)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천정구는 어을매곶이라고도 한다'는 뜻으로, 고려의 천정구현은 고구려 때에는 어을매곶이라고 했다는 뜻이다. 샘(泉)을 더 옛날에는 '어을'(於乙)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어을'이 한글 표기처럼 딱 부러지게 '어을'이라고만 발음한 것은 아니다. 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얼', '엘르', '어르' '어러' 등 여러 가지로 읽었다.
제주도에서는 '어리목'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 혹은 '어리'로 발음했을 것이다. '어름+비'의 '어름'이란 여기서 온 것으로 '천정'(泉井)을 지시하는 말이다. 곧 '샘 우물'을 말한다. 특히 '샘'을 지시한다. 북방 고구려어 계통 언어집단이 남긴 유산이다.

'어름', '비' 모두 북방어로 '샘'
그럼 '비'는 무슨 말일까? 이 말을 '빌레'에서 온 말로 해석한 분이 있다. '어름빌레'라고도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근의 '빌레못'이라는 지명에서 유도된 변음이지 원래 빌레에서 온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퉁구스어권의 나나이어와 솔론어에서 샘을 지시하는 '뷰리'를 조상어로 해서 분화한 말이다. 샘을 '어르(~름)'라 했던 언어집단이 들어온 이후에 '뷰리'라 했던 집단이 들어왔을 것이다. 특히 이 '뷰리'라는 말은 일본 고어에서 '비'로 나타나고, 현대 일본어에선 '비'의 'b'음이 탈락하여 '이'만 남았다. 현대 일본어에서 '우물 정'(井)을 '이'로 발음하는 것이 여기서 분화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국어에서 '우물' 역시 이 '뷰리'에서 'b'음이 탈락하여 오늘날 '우'만 남은 형태다.
따라서 '어름비'의 '비'는 이 집단이 남진 또는 동진하면서 분화한 말의 일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름비'란 '샘+(우)물'이란 뜻이다. 이 말은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포함한 이 일대에서 제주도 지명에만 남아있어 언어집단의 이동 경로를 짐작케 하는 자료다.

'비멘이'란 샘이 있는 마루 오름
어도오름이란 무슨 뜻인가? 어도오름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은 '비멘', '부멘' 혹은 '비멘이', '부멘이'일 것이다. 이 지명은 여기 가까이 있는 오름 이름에서 왔을 것이다.
마을이 형성되면 그 마을 지명은 인접한 산과 같은 두드러진 지형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오름의 이름이 마을 지명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을 보게 되지만 오름이 먼저 있고 마을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다면 '비멘'과 '어도'가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지명 해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지명은 '어도=비멘'의 등식이므로 '어'와 '비'와 그리고 '도'와 '멘'이 대응하는 관계다. '비'는 '어'와 마찬가지로 샘이란 뜻이다. 여기서 '어'는 '얼' 혹은 '어름'의 폐음절어기 때문이다. '멘'과 '도'는 어떤 관계인가? '멘'이란 '마루'의 폐음절형으로서 '뫼' 혹은 '메'에 관형격 어미 'ㄴ'이 붙은 발음이다. 이게 '멩이'가 되어 '부멩이'로 변화하기도 했다.
그럼 '도' 역시 '마루'의 뜻을 가져야 한다. '도'는 '위가 평평한'의 뜻을 갖는 몽골어권의 칼카어와 칼미크어 '달'에서 온 말이다. '달'에서 'ㄹ'이 탈락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 '도(道)'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내오름 지명은 무슨 뜻인가? '도노미'란 말도 여기서 왔다. '위가 평평한'의 뜻을 갖는 말로 몽골어권의 칼카어나 칼미크어 '달'이 있다. 이 말은 개음절로 발음하면 '닥르'가 된다. '위가 평평한 마루'에서 '마루'가 축약하면 '뫼', '메', 혹은 '미'로도 된다. 따라서 '닥라미' 같이 분화한다. 이의 변음이 '도노미' 또는 '도내미'다.
마지막으로 도내오름 지명은 무슨 뜻인가? '도노미'란 말도 여기서 왔다. '위가 평평한'의 뜻을 갖는 말로 몽골어권의 칼카어나 칼미크어 '달'이 있다. 이 말은 개음절로 발음하면 '닥르'가 된다. '위가 평평한 마루'에서 '마루'가 축약하면 '뫼', '메', 혹은 '미'로도 된다. 따라서 '닥라미' 같이 분화한다. 이의 변음이 '도노미' 또는 '도내미'다.
'부면'은 샘이 있는 마루, '어도' 역시 샘이 있는 마루의 뜻이다. 도내오름 혹은 도내미, 도노미는 위가 평평한 마루의 뜻이다. '마루'를 '모이' 혹은 '뫼'라 하는 것은 아이누어에서 기원한다. 한편, 남조순오름을 도노미 혹은 도내미라고도 한다. 본 기획 116회를 참조하실 수 있다. 역시 평평한 마루라는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어도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와 봉성리에 걸쳐 있는 오름이다. 고전에는 도내산(道內山), 어도악(於道岳) 등으로 나오고, 오늘날엔 어도오름, 도노미, 도내미라고 부르고 있다.
이 오름 근처에 있는 마을을 '어음리'라고 한다. 이 마을은 상동과 하동으로 나뉜다. 상동은 '어름비' 일대, 하동은 '부멘이' 혹은 '비멘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어름비', '어림비', '어림빌레'라고 한다. 이 일대의 지명은 여기에 보이는 '도내', '어도', '비멘', '부멘', '어름비'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어도오름. 귀덕리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등성이가 평평하다. 김찬수
우선 고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빙비'(氷非)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오는 '어름비'의 한자 차용 표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나오는 '어름비'는 무슨 뜻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어름비'라는 지명은 '어름+비'의 구조다. 우리 고어에 샘을 '얼'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고려 때 나온 삼국사기 지리지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천정구현일운어을매곶(泉井口縣一云於乙買串)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천정구는 어을매곶이라고도 한다'는 뜻으로, 고려의 천정구현은 고구려 때에는 어을매곶이라고 했다는 뜻이다. 샘(泉)을 더 옛날에는 '어을'(於乙)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어을'이 한글 표기처럼 딱 부러지게 '어을'이라고만 발음한 것은 아니다. 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얼', '엘르', '어르' '어러' 등 여러 가지로 읽었다.
제주도에서는 '어리목'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 혹은 '어리'로 발음했을 것이다. '어름+비'의 '어름'이란 여기서 온 것으로 '천정'(泉井)을 지시하는 말이다. 곧 '샘 우물'을 말한다. 특히 '샘'을 지시한다. 북방 고구려어 계통 언어집단이 남긴 유산이다.

봉성리 구몰동길가에 있는 못. 어도오름 주변 곳곳에 샘이 있다. 김찬수
'어름', '비' 모두 북방어로 '샘'
그럼 '비'는 무슨 말일까? 이 말을 '빌레'에서 온 말로 해석한 분이 있다. '어름빌레'라고도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근의 '빌레못'이라는 지명에서 유도된 변음이지 원래 빌레에서 온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퉁구스어권의 나나이어와 솔론어에서 샘을 지시하는 '뷰리'를 조상어로 해서 분화한 말이다. 샘을 '어르(~름)'라 했던 언어집단이 들어온 이후에 '뷰리'라 했던 집단이 들어왔을 것이다. 특히 이 '뷰리'라는 말은 일본 고어에서 '비'로 나타나고, 현대 일본어에선 '비'의 'b'음이 탈락하여 '이'만 남았다. 현대 일본어에서 '우물 정'(井)을 '이'로 발음하는 것이 여기서 분화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국어에서 '우물' 역시 이 '뷰리'에서 'b'음이 탈락하여 오늘날 '우'만 남은 형태다.
따라서 '어름비'의 '비'는 이 집단이 남진 또는 동진하면서 분화한 말의 일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름비'란 '샘+(우)물'이란 뜻이다. 이 말은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포함한 이 일대에서 제주도 지명에만 남아있어 언어집단의 이동 경로를 짐작케 하는 자료다.

어음2리 '어름비' 못으로 샘이 솟는다. 김찬수
'비멘이'란 샘이 있는 마루 오름
어도오름이란 무슨 뜻인가? 어도오름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은 '비멘', '부멘' 혹은 '비멘이', '부멘이'일 것이다. 이 지명은 여기 가까이 있는 오름 이름에서 왔을 것이다.
마을이 형성되면 그 마을 지명은 인접한 산과 같은 두드러진 지형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오름의 이름이 마을 지명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을 보게 되지만 오름이 먼저 있고 마을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다면 '비멘'과 '어도'가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지명 해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지명은 '어도=비멘'의 등식이므로 '어'와 '비'와 그리고 '도'와 '멘'이 대응하는 관계다. '비'는 '어'와 마찬가지로 샘이란 뜻이다. 여기서 '어'는 '얼' 혹은 '어름'의 폐음절어기 때문이다. '멘'과 '도'는 어떤 관계인가? '멘'이란 '마루'의 폐음절형으로서 '뫼' 혹은 '메'에 관형격 어미 'ㄴ'이 붙은 발음이다. 이게 '멩이'가 되어 '부멩이'로 변화하기도 했다.
그럼 '도' 역시 '마루'의 뜻을 가져야 한다. '도'는 '위가 평평한'의 뜻을 갖는 몽골어권의 칼카어와 칼미크어 '달'에서 온 말이다. '달'에서 'ㄹ'이 탈락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 '도(道)'로 나타난 것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부면'은 샘이 있는 마루, '어도' 역시 샘이 있는 마루의 뜻이다. 도내오름 혹은 도내미, 도노미는 위가 평평한 마루의 뜻이다. '마루'를 '모이' 혹은 '뫼'라 하는 것은 아이누어에서 기원한다. 한편, 남조순오름을 도노미 혹은 도내미라고도 한다. 본 기획 116회를 참조하실 수 있다. 역시 평평한 마루라는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3] 3부 오름-(82) 저…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2] 3부 오름-(81)모…
- 03:2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1] 3부 오름-(80)어…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0] 3부 오름-(79)고…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9] 3부 오름-(78)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8] 3부 오름-(77)각…
- 03:4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7] 3부 오름-(76) 단…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6] 3부 오름-(75)남…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5] 3부 오름-(74)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4] 3부 오름-(73)녹…















 2025.04.08(화) 14:54
2025.04.08(화) 14:54